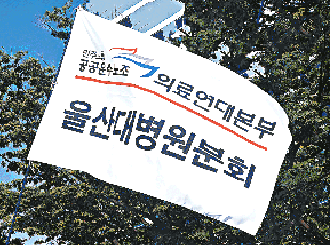감염병동 폐기물통서 찔렸는데
병원 의료진 누구도 안 알려줘
약 먹고 토하며 1주일 더 근무
“약이 너무 독해 밥도 못 먹어 죽을 먹는다. 불안한 마음에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울산대학교 병원 청소노동자 전모 씨(50)는 지난달 20일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다. “에이즈 환자만 아니면 되요”라는 전씨를 향해 의사는 되레 “에이즈 환자인 줄 몰랐느냐”고 타박했다.
이점자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 민들레분회장은 “우리는 그림자다. 간호사나 조무사 등은 환자가 무슨 병을 앓는지 알지만 우리는 전혀 모른 채 환자 주변을 청소한다”며 “최소한 에이즈 환자 등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는 미리 알려줘야 일할 때 더 조심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께 여느 때처럼 맡은 병동 청소를 끝내고 뒷정리를 했다. 전씨가 맡은 병동은 혈액암 병동이다. 환자의 각혈이나 토사물을 치워야 한다.
전씨는 청소할 때 감염 위험을 줄이려고 일회용 비닐 가운을 입는다. 가운은 청소 마치면 병동에 마련된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버린다. 이날도 수거함에는 간호사 등 다른 이들이 버린 가운이 들어차 있었다.
전씨는 가운을 벗어 수거함에 넣었다. 비닐가운은 쉽게 부풀어 올랐다. 전씨는 무심하게 손으로 가운을 눌러 넣었다. 그 순간 따끔한 것이 전씨의 왼손 중지를 찔렀다. 주사바늘이었다.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바늘에 찔린 부분을 눌러 피를 빼 물로 씻어내고, 응급실로 향했다. 간호사는 전씨의 얘기를 듣고 응급조치한 뒤 3일 동안 먹을 약을 챙겨줬다.
이때까지도 전씨는 그 약이 무슨 약인지도 몰랐다. 이점자 분회장은 “응급조치를 하면서도 에이즈 환자라는 얘기를 안해 줬다. 3일이나 지나 담당 교수에게 ‘에이즈 환자만 아니면 되요’라고 했는데 ‘에이즈 환자’라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덕분에 전씨는 3일 동안 독한 약을 먹으면서 계속 일했다. 계속 속이 메스껍고, 구토, 두통도 있었지만 으레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전씨는 주사바늘의 주인이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안 뒤에도 일주일을 더 일해야 했다. 하청업체 관리자는 감염이 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투였다.
노조는 지난달 29일 마무리되지 않은 2014년 임단협 교섭 자리에서 전씨의 유급휴가를 요구했다. 그제야 업체는 전씨의 휴가를 허용했다. 전씨는 2~24일까지 쉰다.
지난달 19일 감염 검사를 받은 전씨는 오는 23일에야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담당의사는 주사바늘에 찔려 감염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위로했지만, 전씨는 불안하다.
이점자 분회장은 “10년 넘게 일했지만, 지금까지 에이즈 환자의 주사바늘에 찔린 조합원은 처음 본다”며 “작년에도 병원 감염관리과에 교육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병원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전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도록 산재 신청도 준비중이다. 노조는 2011년 서울대병원에서 같은 사건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전씨도 인정받을 걸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