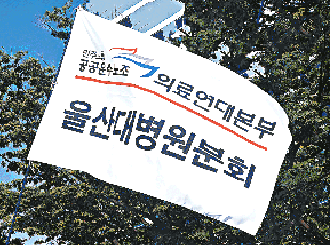지난달 12일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환자 보호자의 ‘갑’질 논란보다는 그 이면엔 열악한 간호사의 노동조건이 숨어 있다.
사건이 일어난 병동엔 환자 침상이 54개나 있는데 주간엔 간호사 4명, 보조원 1명이 함께 일한다. 하지만 사건은 근무자가 더 적은 새벽 시간에 일어났다.
새벽 근무땐 간호사 3명이 54개 병상을 모두 돌본다. 간호사 1명이 18명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 이 때 응급상황이라도 나면 인력은 더 부족해진다.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어김없이 응급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병원에 입원한 환자 A씨(80)를 돌보던 딸 B씨는 담당 간호사에게 환자의 가래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간호사는 응급환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뒷정리하는 중이었다. 이 간호사는 응급상황을 정리한 뒤 제거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간호사는 동료 간호사에게 가래 제거를 부탁했다.
오전 6시께 이 간호사는 병동을 순회하다가 A씨가 숨쉬기 힘들어하는 걸 보고 다시 가래 제거를 시행했다. 가래 제거를 마쳐도 A씨가 숨쉬기 힘들어하자 간호사는 담당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다른 처치를 이어갔다.
환자의 딸 B씨는 간호사가 가래를 빨리 제거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며 간호사의 왼쪽 뺨과 이마를 때리고 폭언했다.
울산대병원은 B씨를 폭행 혐의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B씨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이장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장은 “환자 보호자의 의료진 폭행은 대부분 인력 부족 때문에 일어나기에 병원이 재발을 막으려면 간호사 인력을 늘려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 분회장은 “울산대병원은 올해부터 상급병원(3차 의료기관)이 돼 병동은 늘렸지만 간호사 충원엔 소극적”이라고 덧붙였다.
병원의 한 간호사는 “보호자 심정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당시 상황이 머릿속에서 그려진다”고 안타까워했다.